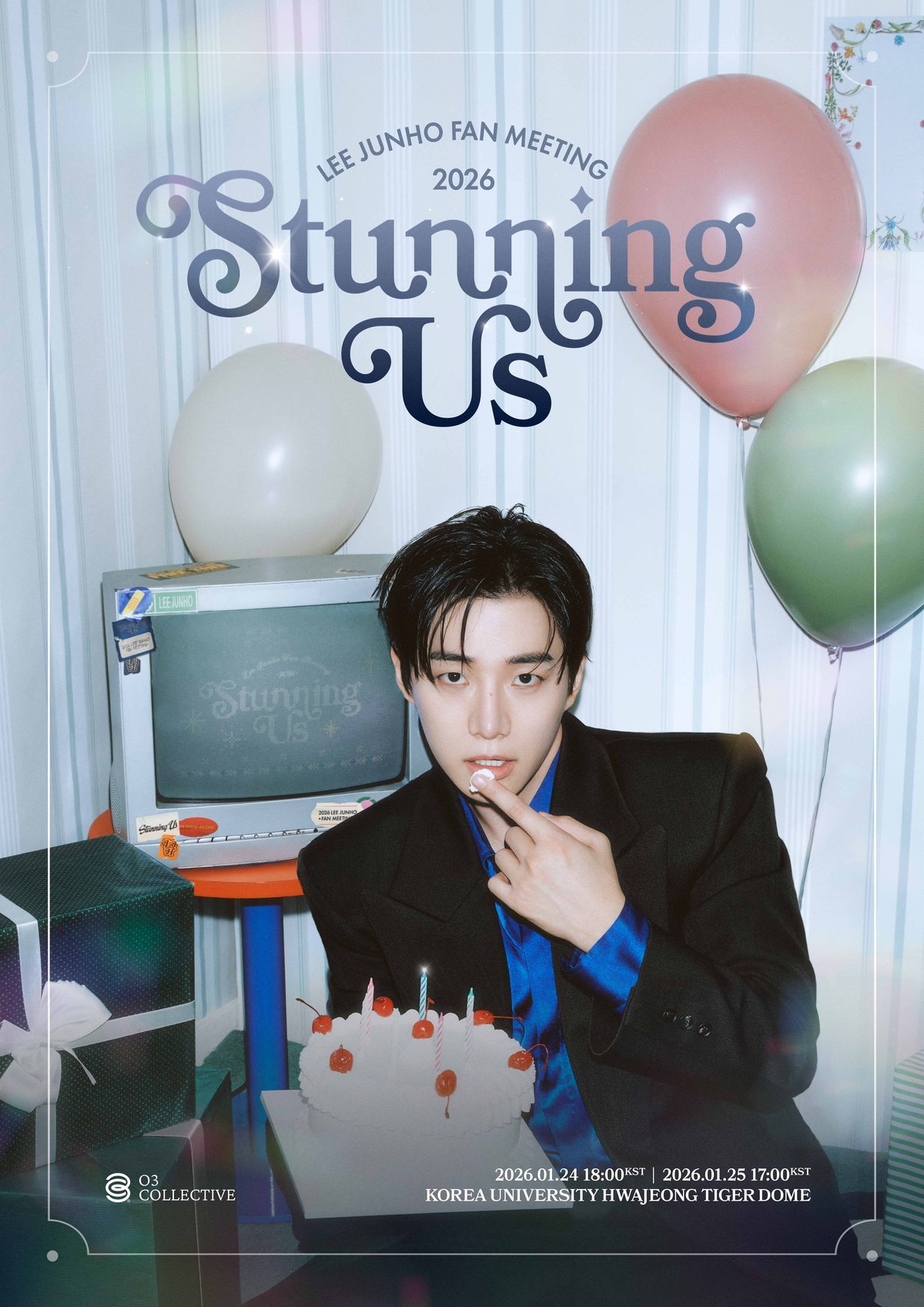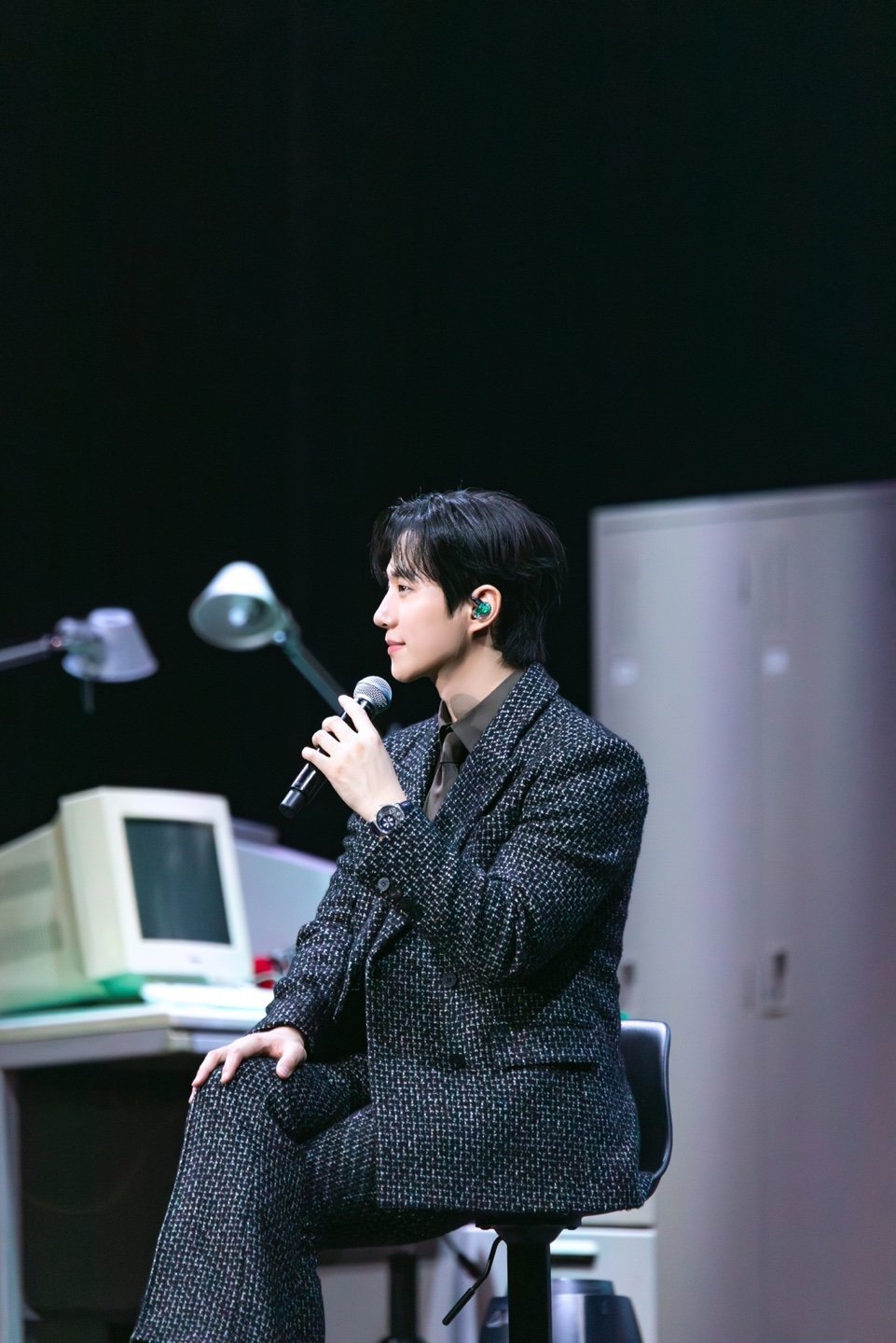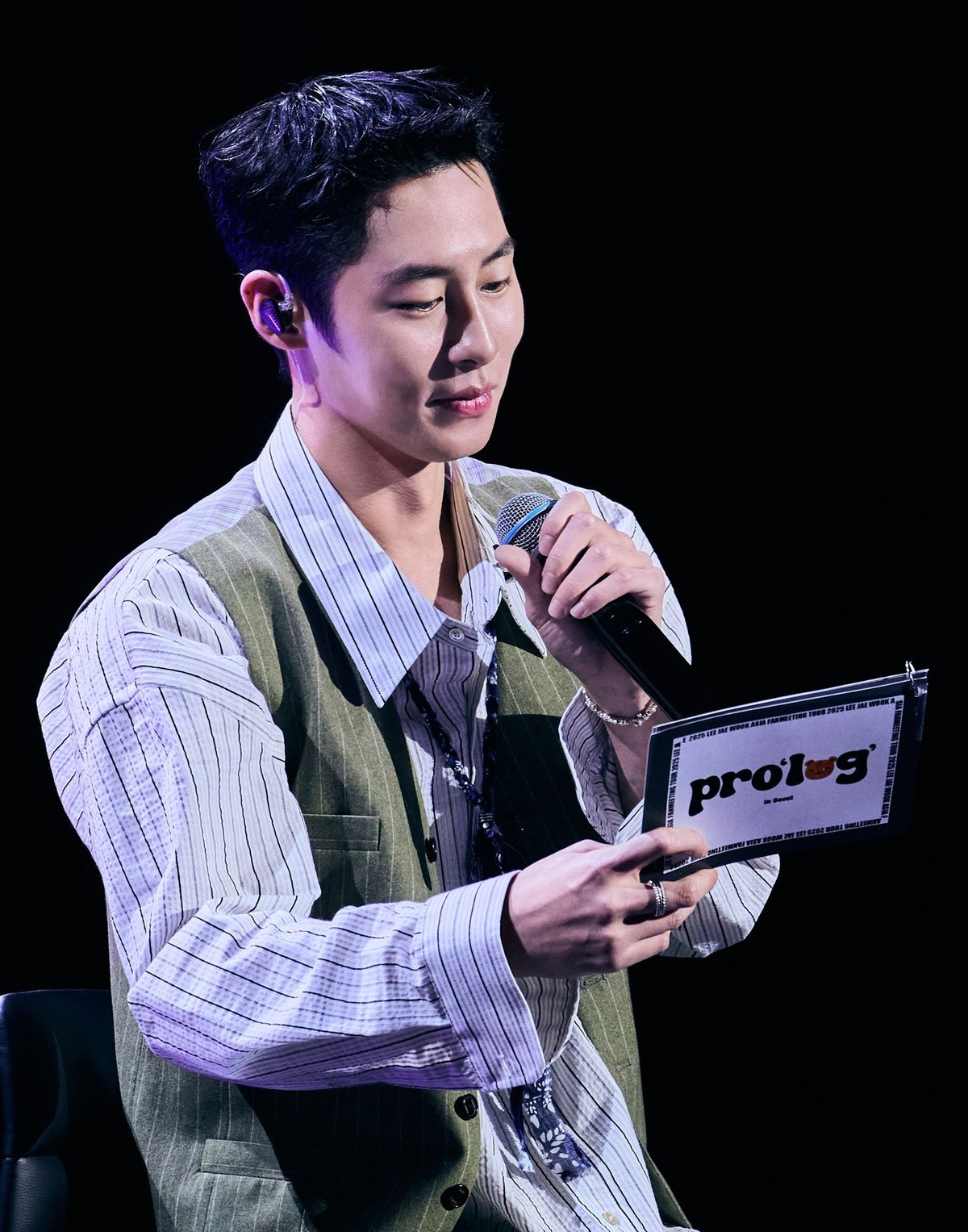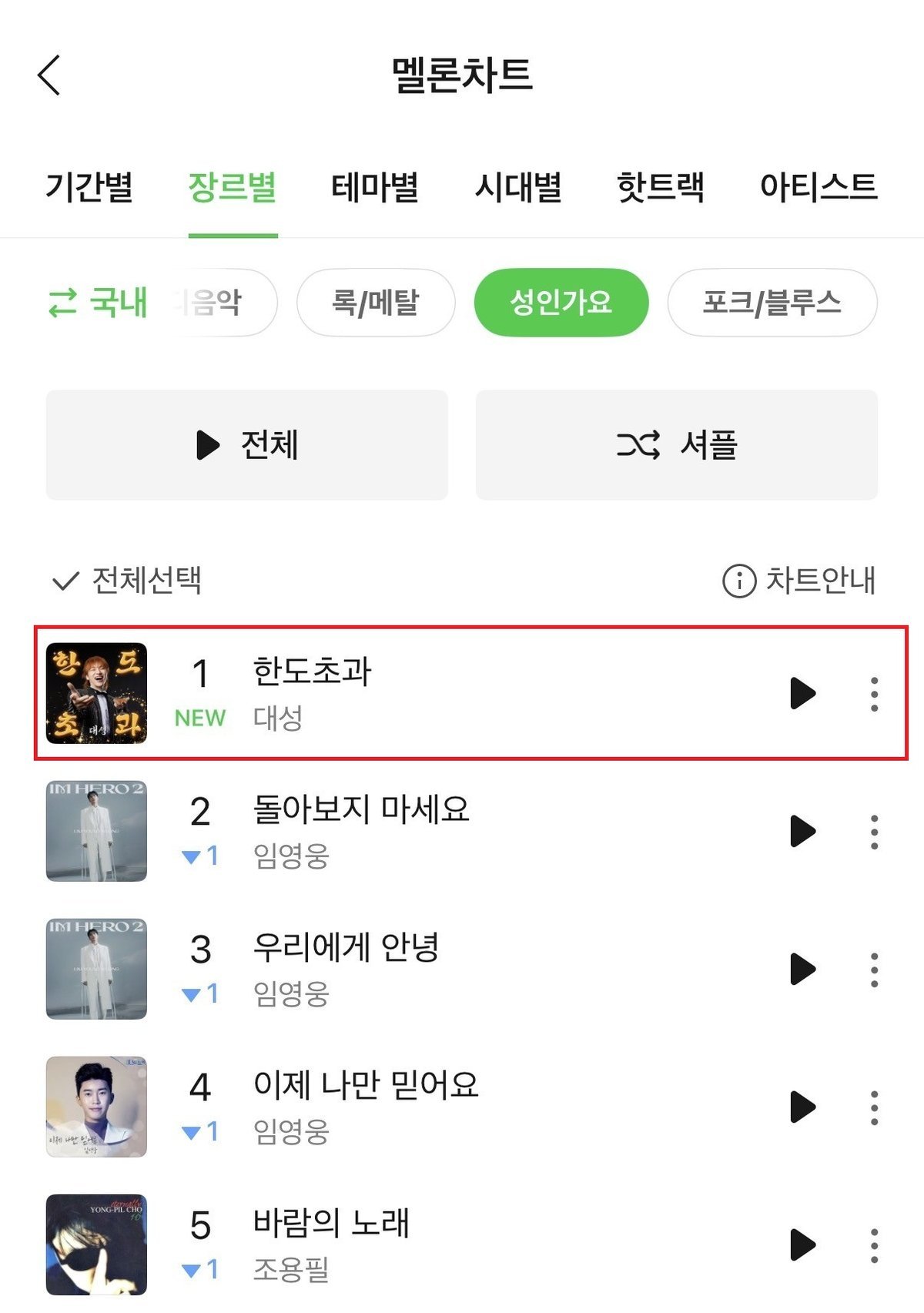- 기자

[PEDIEN]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'상습 채무 불이행자' 명단 공개 제도가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현재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1명꼴인 11%만이 명단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
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(국토교통위원회)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자료를 분석한 결과, 25년 7월 기준으로 임차 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 4,243명에 달했다. 그러나 이 중 실제로 '상습 채무 불이행자'로 공개된 인원은 1,612명에 불과했다.
공개된 미반환 채무액 역시 최소 8조 4,982억 원에 이르지만, 명단에 오른 채무액은 2조 7,46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. 이는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.
현행 '주택도시기금법'에 따르면,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공개되려면 구상채무 발생, 3년 이내 별개 채무 사실, 미반환 금액 2억 원 이상, 강제집행 효력 발생 등 4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 이처럼 모든 요건에 해당하기가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.
특히 구상채권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.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, 전세사기 평균 피해 보증금 규모는 2억 원 이하가 84.2%로 가장 많았다. 대다수 피해자가 2억 원 미만의 보증금을 떼였음에도, 2억 원 이상일 경우만 공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.
이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미반환 보증금 1억 원 이상일 때 공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낳는다. 또한 이미 상습적인 채무 불이행이 확정되었음에도, 통상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'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및 효력 발생'까지 기다려야 하는 요건 역시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.
안태준 의원은 “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,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안 의원은 “현실과 괴리된 공개 요건을 완화하여 이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
저작권자 ©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